I. 사실관계 및 판결요지 : 대법원 제3부 2005.10.28선고 2005도1247판결
원심은 피고인 甲, 乙을 히로뽕 수수 및 밀반입 사실로 유죄로 판단하였다. 피고인들은 사전에 히로뽕 매수, 밀반입 의사가 없었으나, 甲의 애인 A가 ‘서울지검 마약반 정보원 B가 다른 정보원의 배신으로 구속되어, 마약반에서 B의 공적을 만들어 빼내려 한다. 이에 필요한 히로뽕을 구해 달라. 검찰이 안전을 보장한다’고 하고 구입자금까지 교부, 甲에게 부탁, 甲은 이들을 돕기로 하고 乙에게 사정을 설명, 히로뽕 매입을 의뢰하여 乙이 히로뽕을 구입, 甲에게 교부, 범행에 이른 것으로 위법한 함정수사를 주장, 상고하였다. 상고심(대법원2004. 5. 14.선고 2004도1066판결)은 위 주장의 가능성을 인정, 함정수사에 의해 범의가 유발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단정한 원심에 심리미진,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 파기 환송하였다. 환송 후 원심(서울고법2005.1.28선고 2004노1222판결)은 사전에 범의를 갖지 않은 자에게 수사기관이 범행을 적극 권유, 범의를 유발, 범행에 이르게 하여, 공소제기 함은 적법한 공소제기로 볼 수 없어, 공소제기절차가 법률규정에 위배되어 공소기각판결을 하였다. 검사가 상고하였다. 상고심은「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단순히 범행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 불과한 수사방법이 경우에 따라 허용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함을 면할 수 없고 이러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고 하여 상고 기각하였다.
II. 대상판례의 검토
1. 함정수사의 의의와 적법성 판단
함정수사(陷穽搜査)란 수사기관 또는 그 협력자가 범행을 유발하여 그 실행을 기다려 이를 체포하는 등의 수사방법으로 구체적인 형태에 따라 영미에서는 sting operation, undercover investigation 등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통상 뇌물수수, 매춘, 도박, 약물범죄 등 범행이 은밀하게 이루어져 외부포착이 어려운 유형의 범죄행위 검거에 활용되는데, 조직범죄나 테러 등에 대한 수사기법으로서도 활용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다만 수사의 상당성 및 신뢰원칙에 따라,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국민의 사법적 신뢰(judicial integrity)에 위배될 수 있어, 허용한계와 함께 위법한 함정수사에 대한 법적효과가 주로 논의되어 왔다.
2. 함정수사의 허용한계
가. 기회제공형과 범의유발형 함정수사
함정수사의 허용한계와 관련, 한국 및 일본의 학설, 판례에서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견해(일본하급심판례 중, 함정수사는「국가가 일면에서는 범인을 제조하고 타면에서 이를 체포하는 극단의 모순적 조치로 도저히 용인될 수 없다」고 판시한 예가 있다. 木黃浜地判昭和26·6·19裁判所時報87·3頁; 木黃浜地判昭和26·7·17高刑集4卷14·2083頁)나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견해(다만, 종래 일본최고재판소는「타인의 유혹에 의하여 범의를 발생되거나 강화된 자가 범죄를 실행한 경우, 일본형사법 상 그 유혹자가 경우에 따라서는… 교사범 또는 종범으로 죄책을 부담함은 별론 으로, 그 타인인 유혹자가 일반사인이 아닌 수사기관이라는 점만으로 그 범행 행위자의 범죄구성요건해당성 또는 책임성이나 위법성을 조각하거나 공소제기절차규정에 위반 또는 공소권이 소멸된 것이라 할 수 없음은 다언을 요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最決昭和28·3·5刑集7卷3號482頁; 最判昭和29·8·20刑集8卷8號1239頁; 最決昭和29·9·24裁判集刑事98號739頁; 最決昭和36·8·1裁判集刑事139號1頁)는 찾아보기 어렵고, 통설은 기회제공형 및 범의유발형으로 구분하여 범의유발형 함정수사를 위법한 유형으로 판단하고 있다(이재상, 형사소송법 제6판, 서울 : 박영사, 176면 이하; 福井厚, 刑事訴訟法講義 第2版, 東京 : 法律文化社, 2003, 82-83頁; 대법원1963.9.12.선고 63도190판결; 대법원 1982.6.8.선고 82도884판결; 대법원1983.4.12.선고 82도2433판결; 대법원1992.10.27.선고 92도1377판결; 대법원2004. 5. 14.선고 2004도1066판결. 특히 대법원은 기회제공형을 함정수사의 범주에서도 제외한다.; 일본하급심판례로, 東京高判昭和26·11·26高刑集4卷13號1933頁; 東京高判昭和60·10·18刑月17卷10·927頁; 大阪高判昭和63·4·22判タ680號248頁).
앞서와 같이 종래 일본최고재판소는 기회제공형, 범의유발형의 구별 없이 함정수사를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데, ① 수사절차의 위법이 곧바로 공소제기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고(東京高判昭和26·12·11高刑集4卷14·2074頁), ② 수사기관의 함정설정이 위법하다면, 이를 교사, 종범으로 처벌하거나 ③ 정상사유로의 참작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시각이 배경이 된 것이다. 그러나 관련판례의 사실관계가 대부분 기회제공형에 해당하고, 최고재판소도 마약거래와 관련 수사정보원을 활용한 사안(最決平成16·7·12刑集58卷5號333頁)에서「직접적 피해자가 없는 약물범죄 등의 수사에서 통상적 수사방법만으로 당해 범죄의 적발이 곤란한 경우, 기회가 있다면 범죄를 행할 의사가 있다고 의심되는 자를 대상으로 함정수사를 행함은 형소법 제197조 1항의 임의수사로서 허용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판시함으로써 적법한 함정수사 요건으로 첫째, 약물범죄 등 소위 피해자 없는 범죄(victimless crime)와 같은 대상범죄에 제한, 그 필요성이 인정되고, 둘째, 통상적 수사기법에 의한 증거수집, 검거가능성이 극히 제한적인 경우, 셋째, 사전에 범행의사가 있다고 의심되는 자를 대상으로 할 것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기존 한국, 일본의 관련판례에서 기회제공형이 대부분으로, 위법한 함정수사의 주장이 피고인의 방어방법으로 과연 어느 정도 유용한 것인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나. 미국의 entrapment defense ; subjective test 및 objective test
범의유발형, 기회제공형 함정수사의 구분은 미국의 entrapment defense의 영향이라 하겠다. 미국에서 함정수사의 한계에 관한 논의는 1870년대 후반 주 법원 판례 등에서 확인되는데, 1900년대 초까지 미 판례는 피고인의 범행진행, 가담에 주목, 수사기관의 함정설정에 대해서는 착안하지 않았다(People v. Mills, 178 N.Y. 274, 70 N.E. 786(1904)). 그러나 1932년 Sorrells v. United States(287 U.S. 435, 53 S.Ct. 210, 77 L.Ed. 413(1932))에서 미연방대법원이 후술 주관적 기준을 제시한 이래, 연방하급심 및 주법원에서 이를 원용하기 시작하였다. entrapment defense의 판단요소로 ① 수사기관의 함정설정행위(inducement), ② 함정설정 전 대상자가 갖는 심리적 상태로서의 범행의사(predisposition)를 드는데, 위 판단요소 중, 중점대상에 따라 주관적 기준(subjective test, Sherman-Sorrells doctrine), 객관적 기준(objective test, hypothetical person approach), 절충적 기준으로 구분된다. 미국의 다수설인 주관적 기준은 수사기관의 함정설정에도 불구, 피고인이 이미 범행의사를 갖는 경우(ready and willing by the time), 당해 함정수사는 적법하다는 입장으로 실체형벌법규의 입법자는 수사기관에 의하여 창출된 범죄행위까지 처벌할 것을 상정하지 않은 점을 논거로 한다(실체법적 접근). 이에 따르면, 피고인이 우월적 증명(preponderance of evidence)으로 수사기관에 의한 함정설정을 입증하면, 검찰 측이 합리적 의심이 해소될 정도로(beyond reasonable doubts) 피고인의 사전 범행의사를 입증하는 공방(攻防)구조를 뛴다. 문제는 피고인의 사전 범행의사 입증에 과거 범죄경력, 악성격, 평판, 취향 등 부당한 편견을 야기할 수 있는 성격·유사사실증거 등이 원용되며, 피고인의 심리적 상태라는 모호한 기준에 의존하는 점 등의 문제가 제기된다. 반면, 객관적 기준은 entrapment defense는 위법한 수사의 제어를 목적으로, 위법한 수사관행을 법원이 사후적으로 승인할 수 없는 점에서(절차법적 접근), 평균적 일반인을 상정, 수사기관의 구체적 함정설정행위를 고려, 범행의사를 갖지 않은 자가 범행에 이를 정도의 실질적 위험(substantial risk)의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Model Penal Code §2.13). 객관적 기준에 의하면 주관적 기준의 문제점은 어느 정도 해소되지만, 실질적 위험역시 모호한 기준이며, 상습적 범죄자에 대한 대처, 범행의사여부를 전적으로 무시하고 수사기관의 함정설정에 실질적 위험이 없다고 판단하는 예와 같이 오히려 부당하게 함정수사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될 여지가 대폭 확장될 수 있는 문제점 등이 지적된다. 한편, 우편에 의한 아동포르노물의 유통과 관련(Jacobson v. United States503 U.S. 540, 112 S.Ct. 1535, 118 L.Ed.2d 174(1992)), 미연방대법원은 종전 주관적 기준과 달리, 피고인의 사전 범행의사판단에 수사기관의 함정설정과정, 범행에 개입형태 및 기간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 기준을 일부 수용하여 소위 절충적 기준을 취한 바 있다.
3. 위법한 함정수사에 대한 구제
위법한 함정수사(범의유발형)의 구제와 관련, 실체법적 접근에서 ① 가벌적 또는 실질적 위법성이 조각되어 무죄판결을 하여야 한다는 견해(신양균, 형사소송법, 서울 : 법문사, 2000, 70면), 절차법적 접근에서 ② 위법한 수사방법으로 국가가 처벌적격을 상실하여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는 견해, ③ 위법한 수사에 의한 공소제기로 공소기각판결을 하여야 한다는 견해(백형구, 형사소송법강의 제8정판, 서울 : 박영사, 2001, 365면), ④ 위법한 함정수사에 의한 증거를 위법수집증거로 증거능력을 부인하여야 한다는 견해 등이 제시되는데, ④의 입장(可罰說. 이재상, 전게서, 179면; 石神千織, 搜査節次におけるおとり搜査, 警察學論集 第58卷 9號, 2005, 164-165頁)은 ①설에 대하여는 위법한 함정수사라도 범죄성립요건이 갖추어진 이상, 무죄판단은 곤란하고, ②설에 대하여는 위법한 함정수사가 명문의 면소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③설에 대하여는 위법한 수사에 따른 공소제기 시, 공소기각판결을 한다는 명문규정이 없고, 수사, 공판절차는 독립성을 갖는 점에서 수사절차의 위법이 공소제기에 그대로 인계되지 않는 점(종래 한국 및 일본의 판례 역시 수사절차의 위법과 공소제기효과를 분리시키는 입장을 일관하였다. 대법원 1992.4.24. 선고 92도256 판결 등; 最判昭和41·7·21刑集20卷6號6767頁, 大阪高判昭和63·4·22判タ680·248頁 등) 등을 논거로 비판한다.
그러나 수사, 공판절차가 전혀 무관계한 것은 아니고, 적정절차원칙, 피의자·피고인의 기본권보호라는 점에서 수사절차의 위법이 공소제기효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론적 구성은 충분히 가능하고, 정책적 필요성면에서도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과 별도로 수사절차에 중대한 위법이 게재된 때는 이에 따른 공소제기에 대하여 공소기각판결(형소법 제327조 2호)을 할 수 있다고 하겠다(福井厚, 前揭書, 228-229頁). 참고로, 일본 하급심판례 중에 적정절차위반의 함정수사에 따른 공소제기가 무효화될 수 있다고 판시한 예도 있다(東京高判昭和57·10 ·15判時1095號155頁).
4. 대상판례의 의의
방어방법으로 함정수사의 유용성에 대한 의문은 ① 기존 관련판례가 수사기관의 함정설정측면보다는 피고인의 범행의사라는 심리적 상태에 주안을 두어, 대부분 사례가 기회제공형으로 판단되었고, ② 통상 함정수사의 원용 시, 피고인의 유죄인정이 논리적 전제가 되는 점 등에 주로 기인한다. 대상판례는 피고인의 범행의사 고려 시, 범행자금 및 구체적 범행방법제시 및 대가제공 등 수사기관이 범행의 전 과정에 적극 개입한 점을 고려, 위법한 함정수사(범의유발형) 가능성을 지적하여 종래(주관적 기준)와 달리 수사기관에 의한 범행유발의 실질적 위험성을 고려(객관적 기준), 대법원이 판단한 최초의 위법한 함정수사사례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절충적 기준). 아울러, 위법한 함정수사에 따른 공소제기 효과와 관련, 공소제기가 법률의 규정에 위배되어 공소기각판결을 한 원심을 지지하여, 수사절차의 위법과 공소제기효과를 분리하던 기존시각에 변화를 추측케 한다. 장래 판례축적과 함께, 함정수사의 한계에서 수사기관의 함정설정과 관련한 구체적 판단기준과 함께 어떠한 경우에 수사절차의 위법이 공소제기의 효과에 연계될 수 있는지, 추가적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_01.jpg&w=3840&q=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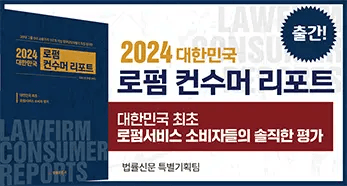

.jpg&w=3840&q=75)


.jpg&w=3840&q=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