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대상판결 요지
피고인은 1997년 8월23일 전라남도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피고인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의 범행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운전면허취소처분’이라 한다)을 받은 사실, 그 후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은 1997년 11월28일 피고인의 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의 범행에 대하여 무혐의처분을 한 사실, 전라남도지방경찰청장은 2007년 6월8일 피고인이 위와 같이 무혐의처분을 받았음을 이유로 이 사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철회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는 바, 이와 같이 피고인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의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음을 이유로 전라남도지방경찰청장이 이 사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철회했다면, 이 사건 운전면허취소처분은 행정쟁송절차에 의해 취소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처분시 소급해 효력을 잃게 되고, 피고인은 그 처분에 복종할 의무가 당초부터 없었음이 후에 확정됐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2. 11. 8. 2002도4597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2007년 4월9일에 한 자동차운전행위는 무면허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무면허운전에 해당한다고 오인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으니, 원심판결에는 운전면허취소처분의 철회의 효력 및 무면허운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Ⅱ. 문제 제기
행정행위의 공정력이 문제되는 상황은 사안처럼 중간에 일정한 법사실이 생긴 경우이다. 일찍이 대법원 1993년 6월25일 선고 93도277판결과 대법원 1999년 2월5일 선고 98도4239판결은 행정행위의 공정력에 취소판결의 소급효를 곧바로 대입해 행정행위의 공정력을 공동화했다. 대상판결 및 직접적인 참조판례인 대법원 2002년 11월8일 2002도4597판결은 이런 기조를 그대로 수용해 취소판결의 소급효적 관점을 부담적 처분의 철회에 연계시켜 철회의 소급효를 논증했다. 양자 공히 취소판결의 소급효를 행정행위의 공정력에 관한 논의에 그대로 대입한 결과이다. 그리하여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법도그마틱인 행정행위의 공정력이 전적으로 절차적 의미만을 지닌다고 확인된다. 판례의 이런 기조가 이미 행정법도그마틱상으로 확고히 굳어졌다고 할 것 같으면, 행정법문헌상의 행정행위의 공정력에 관한 일반적 논의는 지극히 공허할 수밖에 없고, 획기적인 방향전환이나 자기부정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판례의 이런 기조는 핵심적인 행정법도그마틱을 전도(顚倒)시킨다. 즉 행정행위론의 근간인 공정력의 본질 및 행정행위의 존재이유를 훼손하는 것이거니와, 자칫 취소소송의 성질까지도 통설에서 벗어나 확인소송으로 봄직한 전조가 된다. 무엇보다도 공권력행사에 대한 개인의 대응양상에 따른 법질서의 왜곡이 빚어질 수 있다. 가령 부담적 처분을 무시하고 범법행위를 저지르며 그것의 위법성을 다툰 자가, 부담적 처분을 따르면서 그것의 위법성을 다툰 자에 비하면 결과적으로 이익을 누리는 셈이 된다. 이 같은 결과를 전자가 후자에 비해 확고한 권리의식을 지녔다는 식으로 치부할 순 없다. 준법으로 인한 불이익의 초래는 자칫 법적 아노미와 법적 안정성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
Ⅲ. 대상판결의 문제점
1. 철회논증상의 문제점
원심(광주지방법원 2007. 10. 18. 선고 2007노1453판결)은 행정행위의 철회가 있더라도, 철회이전에 범한 법위반에 대한 평가를 달리 할 순 없다고 본다. 행정행위의 철회의 효과가 통상 미래(장래)효(ex nunc)인 점에서, 원심은 행정행위철회론에 충실하며, 그 자체로선 수긍이 가는 논증이다. 반면 대상판결은 분명 행정행위의 철회의 차원에서 논증을 하면서도, 여기에 취소판결의 소급효를 대입시킨다. 그리하여 철회의 미래(장래)효가 수정됐다. 물론 철회의 효과를 일률적으로 미래효로 단정할 순 없고, 철회의 의미가 무의미할 수 있는 경우엔 그것의 소급효를 인정하지 않으면 안된다(가령 기왕에 보조금과 같은 급부가 행해졌는데 그에 요구되는 부담을 불이행한 경우엔, 철회효과를 소급적으로 설정해야 한다. 김남진/김연태, 행정법Ⅰ, 2007, 309면; 김동희, 행정법Ⅰ, 2007, 358면).
따라서 철회의 미래효적 도그마틱의 수정이 설득력이 있게 논증되어야 한다. 오늘날 직권취소가 쟁송취소와는 엄연히 구별되고, 도리어 철회와의 공통점을 많이 드러내는 점에서, 철회에 쟁송취소의 법리를 대입시키는 것은 행정행위철회론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그런데 이미 대법원 2002년 11월8일 선고 2002도4597판결이 이런 하이브리드적 논증을 했고, 그것이 참조판례의 형식으로 그대로 대상판결에 이식됐다. 쟁송취소의 소급효를 그대로 대입한 것이 문제의 근원인 점과는 별도로, 여기선 관련 판례들이 왜 (부담적) 행정행위의 취소의 견지에서 바라보지 않았을까 궁금하다. 철회사유가 되는 새로운 사정의 발생은 원처분당시엔 고려되지 않은 것을 대상으로 한다. 하지만 사안에서 문제되는 것은 원처분당시에 이루어진 사실관계의 포섭이다.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했더라면, 운전면허취소처분이 내려지지 않았을 것이다. 존재하지 않는 사실관계를 출발점으로 삼았기에, 성립당시에 이미 그것은 위법했다(Vgl. Kopp/Ramsauer, VwVfG Kommentar, 8.Aufl., 2003, 쪮48 Rn.29).
요컨대 사안은 행정행위취소의 철회의 차원이 아닌 행정행위취소의 취소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그런데 행정행위취소의 취소에서 문제는 후행 취소만으로 즉, 동종의 행정행위가 새로이 발해지지 않더라도 원처분의 효과가 원처분당시에 소급하여 소생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독일의 경우 일반적으로 취소나 철회의 취소는 문제되지 않고 철회의 철회가 다투어지는 반면, 우리의 경우 판례는 취소의 취소에 대해서 소극적이다(대법원 1979. 5.8. 선고 77누61판결; 대법원 1995. 3.10. 선고 94누7027판결. 이에 대한 심도있는 비판으로 특히 류지태, 행정법의 이해, 2006, 94면 이하 참조. 그리고 대법원 1979년 5월8일 선고 77누61판결에 대한 평석으로 김동희, 행정청에 의한 행정행위의 취소의 취소, 판례회고 제8호, 1980.12., 7면 이하, 대법원 2002.5.28. 선고 2001두9653판결에 대한 평석으로 박해식, 대법원판례해설 제41호, 2002.12., 130면 이하 참조). 만약 여기서 법원이 다른 입장을 가졌다면, -설령 공정력의 약화라는 결과에선 동일하다 하더라도- 구태여 쟁송취소의 소급효를 동원하기보다는 부담적 행정행위의 직권취소에서의 소급효인정을 통해 접근하지 않았을까 짐작해 본다.
2. 公定力과 관련한 問題點
철회적 접근에 취소판결의 소급효를 연계시킨 논증을 가능케 한 것이 바로 대법원 1993.6.25. 선고 93도277판결과 대법원 1999년 2월5일 선고 98도4239판결이다. 이들은 부담적 처분(허가취소처분과 운전면허취소처분)에 위배하여 범한 법위반행위의 가벌성이 문제된 사안이다. 여기서 판례는 행정심판(93도277판결)과 행정소송(98도4239판결)에서 그 부담적 처분이 취소된 이상, 그 행정처분은 처분시에 소급해 효력을 잃게 되고 따라서 “처분에 복종할 의무가 원래부터 없었음이 확정됐다”고 해서 그 법위반행위를 무죄로 선고했다.
우리는 실체적 공정력을 규정한 셈인 독일 행정절차법 제43조 제2항(“행정행위는 직권취소·철회 또는 다른 방법으로 폐지되지 않거나, 시간의 경과나 다른 방법으로 실효되지 않는 한, 유효함에 변함이 없다”)과 같은 조항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판례와 문헌은 강행규정에서 법률행위의 적법성과 유효성을 연계시키는 민법(제103조, 제104조)과는 달리, 행정행위의 공정력의 존재를 통해서 행정행위의 적법성과 유효성(법효과발생)의 불합치를 인정하고 있다. 여기선 공정력의 인정근거 및 그에 따른 내용이 문제된다. 왜냐하면 적법성과 무관한 법효과발생은 그 자체가 법치국가적 원리에 대한 도발이기 때문이다(Ruffert, Erichsen/Ehlers(Hrsg.), Allg. VerwR, 2005, 쪮21 Rn.1). 중대한 위법의 경우 무효가 인정되며, 불가쟁력이 발생하지 않는 한 위법한 행정행위를 다툴 수 있으며, 행정 역시 폐지할 수 있는 수단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그것의 용인에서 가장 걸림돌은 실정법적 근거의 부재이다. 참고로 독일의 경우 행정절차법에 (실체적) 공정력의 근거규정이 마련되기 전에는 그들 행정법원법상으로 행정행위에 대한 구분된 구제가능성(즉, 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에 의거한 쟁송법적 논거가 주효했다. 특히 J. Ipsen은 행정절차법이전에 공정력을 아무런 의문 없이 긍정한 판례와 문헌의 일반적 태도를 두고서, 과거 O. Mayer가 주장한 자기확인설(자기증명설)을 기저에 두고 있다는 점과 그런 상황이 심지어 불문법적으로 인정돼 왔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Ders., Allgemeines Verwaltungsrecht, 2005, Rn. 666ff.).
우리의 경우 독일과 비견한 실체법적 규정이 없기에 과거 Wolff/Bachof가 주창했듯이(Wolff/Bachof,
VerwRⅠ, 9. Auf., 1974, S.414) 법치국가원리의 발현인 법적 안정성에 공정력의 법적 근거를 둘 수밖에 없다. 이는 단순한 이론적 근거를 의미하진 않는다. 따라서 당연히 공정력은 그 자체가 실체적 성격을 지닐 수밖에 없다. 만약 행정쟁송취소의 반사적 효과라는 점이 강조되어 그것이 순전히 절차적인 데에 그친다면, 행정행위폐지이전 그 중간에 발생한 법사실은 자칫 법외적 사건으로 치부될 우려가 있다. 나아가 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간의 제도적 구별이유가 거의 없어진다.
Ⅳ. 맺으면서-발본적인 해결책
여기서 쟁송취소의 소급효에 관해서도 생각할 점이 있다. 비록 공정력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취소판결의 효력을 독일처럼 원칙·예외의 관계에서 접근했으면(Hufen, VerwProzR, 2003, 쪮38 Rn.31; Schoch/Schmidt-AΒmann/Pietzner, VwGO, 1999, 쪮113 Rn.34), 사안처럼 중간에 법사실이 생겼더라도 이상에서 지적한 법적 평가의 불합리한 불평등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나아가 근원적으로 공정력의 인정에 대한 대응기저로 집행정지의 원칙이 채용되었으면, 사안의 전개가 전혀 달랐을 것이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집행정지효의 원칙을 공법쟁송의 근본원칙으로 보아 집행정지와 집행부정지가 원칙과 예외의 관계에 놓이며, 만약 이런 관계를 역전시키는 행정실무는 위헌이라고 판시했다(BVerfG NJW1974, 227; NJW 1980, 35(36)). 법치국가원리적 의문점과는 별개로 집행부정지의 원칙은, 사안에서처럼 법치국가원리에 입각한 행정법도그마틱의 전개를 방해하기도 한다. 금번 행정소송법개정움직임에서 집행정지요건의 완화가 강구된 점은 호평할 만하나, 법치국가원리에 기하여 발본적 해결책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안에선 공정력, 취소판결의 효력 그리고 집행정지와 관련한 문제점이 종합적으로 표출된 셈이다. 요컨대 입법정책적 고려가 법치국가원리를 좌절시킬 순 없으며, 우리의 특유한 법제도라고 해서 귤화위지(橘化爲枳)가 되어선 안 된다.

_01.jpg&w=3840&q=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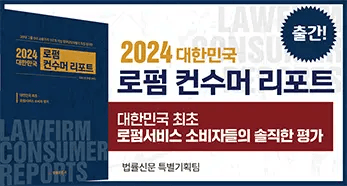

.jpg&w=3840&q=75)


.jpg&w=3840&q=75)
